
은밀한 부위이기 때문일까. ‘전립선’은 대화 소재로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년남성의 대부분은 ‘전립선비대증’으로 고통받고, ‘전립선암’이 남성 암 증가율 1위를 차지한다. 문홍상 교수(의대∙의학)는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 연구로 ‘2014 대한전립선학회 학술대회’ 해외 공모 논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승욱 교수(의대∙의학)는 트위터 속 의학 지식의 진위여부를 분석하는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문홍상 교수, ‘새로운 전립선암 진단 장치’연구

문홍상 교수 연구팀의 논문 제목은 ‘Discrimination between the Human Prostate Normal Cell and Cancer Cell by Using a Novel Electrical Impedance Spectroscopy Controlling the Cross-sectional Area of a Microfluidic Channel’. 이 논문은 전립선 정상 세포와 암세포 간의 구분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한 결과다. 이 장치는 정상 전립선 세포와 암세포의 임피던스(Impedance, 전류가 흐르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수치) 전기저항도 차이를 분석해 암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전립선암 진단은 정확도가 낮고 불편했다. '세침생검술'은 항문을 통해 직장에 넣은 바늘로 전립선의 10~12군데를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전립선 조직 채취 부분을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가 낮았다. 또한 대장균이 득실 되는 직장을 통해 세포를 채취해 자칫 환자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또 '경직장 초음파검사'를 통해 저음영 부분을 찾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저음영 부분은 암이 나올 확률이 다른 부분보다 높지만 별도의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직장을 통해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직장촉진검사’, 혈액 검사의 일종인 ‘전립선특이항원’ 등의 방식이 있다. 이 방식도 암의 가능성은 진단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했다. 문 교수가 연구한 장치는 기존의 검사 방식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전립선학회의 평가다.
검사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검사 방식보다 더 높은 암 진단률을 얻을 수 있고, 검사 시 환자의 불편이 줄어든다. 세포를 채취할 시 정상세포 혹은 암세포인지 구분 지은 뒤 다음 차례의 세포를 채취함으로써 10~12개 부분을 모두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조직검사 시 조직채취 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감염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립선암 진단에 이용하는 기구에 암세포의 전기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부착해 전립선암 진단율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새로운 방식을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승욱 교수, ‘트위터(Twitter) 속 의학 정보’ 분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은 ‘의학 정보’도 공유한다. 하지만 SNS 속 의학 정보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승욱 교수의 연구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논문 제목은 ‘The Analysis of Tweets the Prostate Written in Korean‘. 논문은 트위터(Twitter)에 퍼진 의학 정보, 비의학 정보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SNS를 통해 퍼지는 의료 정보라도 모든 내용이 옳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그릇된 정보로 인해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전립선’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총 641건의 글이 검색됐고, 그 중 198건인 의학 정보는 약 50%만이 실제 의학 정보와 일치했다. 트위터에 퍼진 의학 정보 두 개 중 하나는 ‘일부만 사실’이거나 ‘거짓’이라는 의미다. 이 밖에도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잘못된 지식도 퍼져있었다. 이 교수는 “트위터에 퍼진 그릇된 정보는 환자들에게 옳다고 비춰져 그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며 “추후 학회 차원의 개선방향 혹은 홍보 방안을 구축해 비뇨기과에 대한 잘못된 지식 전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술은 보수적인 학문이다. 수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식만을 인간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치료방식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의사도 시민들이 접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의사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학력 및 약력
문홍상 교수(의대∙의학)는 우리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부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재직 중이다. 현재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이사, 대한요로생식기손상재건연구회 총무이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학술위원, 세계 배뇨장애요실금학회 정회원, 미국비뇨기과학회 정회원, 유럽비뇨기과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욱 교수(의대∙의학)는 우리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2011년도부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재직 중이다. 현재 대한전립선학회 편집이사, 대한남성과학회 이사,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 Korean journal of urology의 ethics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urological oncology의 associate editor,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의 editorial board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2014-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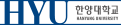 Copyrights (c) 2016 Hany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s (c) 2016 Hany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