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은 세계인의 축제로 불리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즐거움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미국 땅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의술을 행하고 있는 동문들이 있다. 세계 속의 한양인 그 첫 번째, 더 넓은 세상에서 의료인의 꿈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의 이야기다.
의과대학 동문들의 미국 진출 현황
우리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문은 총 9명. 하버드대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 김천기(의학.80) 교수 그리고 김서영(의학.00) 교수, MD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최해선(의학.79) 교수, 매사추세스대(Massachusetts of University) 김영환(의학.86) 교수,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이춘근(의학.87) 교수,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권순호(의학.88) 교수, 알버트아인슈타인 의대(University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조우진(의학.99) 교수,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 김동욱(의학.02) 교수, 드렉셀대학 의대(Drexe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이동흔(의학.00) 교수가 그들이다. 최근 조우진, 김동욱 동문은 정식으로 조교수로 임명됐다. 또한 김서영 동문은 우리대학 출신 최초로 하버드 보건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외에도 여러 동문이 미국 내에서 의사로 활동한다.

국내에서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병원 생활이 점점 더 쉬워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연령이나 지위 고하에도 누구나 처우가 비슷하다. 직급 간 월급의 차이가 크지 않아 초임 발령자와 30년 이상 근속자의 급여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내 초임 임상 강사와 정교수의 월급 차이가 두 배 이상인 경우도 생각하면 비교가 쉽다. 또 병원에서 규정한 나이 이하의 의사는 모두 동일하게 당직 근무를 한다. 김영환 동문은 "병원 규정에는 72세 이상, 봉직 20년 이상 교수만 당직을 면한다는 규정이 있다" 며 "정교수는 초임 발령자보다 1년에 2주 정도 휴가만 길 뿐 병원 근무에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했다.
국내 의대 교수 정년은 60~65세. 그러나 미국에는 정년이 없다. 미국에서는 85세의 나이로 현역에서 활동하는 교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교수가 평생 의사를 업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직원과 마찰이 있거나,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학생과 환자들의 평가가 나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근무 연수가 많더라도 업적이 없으면 승진이 어렵다. 60세가 넘어서도 조교수에 머무르는 교수가 많은 이유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외국인은 더욱 힘들다. 미국 의대는 대부분 자국 졸업생을 선발한다. 미국 내에도 충분히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영환 동문은 "내가 속한 병원의 방사선과는 10년 간 매년 4~5명의 전공의를 뽑았다"며 "그간 외국인은 미국 의사 시험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이수한 뉴질랜드 출신 수재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의사가 중요 보직을 맡기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김 동문은 "미국 철학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외국인에게 주요한 결정권을 내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동문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유다.

권순호, 김서영, 조우진, 김동욱 동문이 전하는 이야기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권순호: 강북삼성병원에서 내분비내과 부과장으로 재직할 때였어요. 미국 당뇨병 학회 모임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와 연구자들을 보며 넓은 세상에서 세계 각국의 의사들과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조우진: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접하고 처음으로 미국행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의사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의사의 본분을 잊은 듯한 참담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2006년 연수 차 미국에 왔는데, 처음 미국 땅을 밟아 낯선 것도 많았지만 한국에서보다 더 역동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스스로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장에서 느낀 미국과 한국 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권순호: 미국에서는 좀 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분한 개인 연구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또한 비교적 많은 시간으로 적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외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우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인해 각국마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인 의료수가가 낮아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의료파업도 이 같은 원인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수가는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척추외과 의사인 저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경감시를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감시란 복잡한 수술 절차, 특히 척수를 다루는데 필요한 절차인데요. 수술 시 실시간으로 신경계통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 하는 것입니다.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을 줄이는 거죠. 때문에 의사로서 의료 원칙에 맞는 교과서적인 치료를 할 수 있죠. 또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이 비교적 미국이 더 탄탄히 구축돼 있어 의사의 근무 환경이 더 좋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다. 유학을 희망하는 의대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김서영: 저는 멋진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의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유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엔 미래에 '무엇이 되어야겠다', 혹은 '무슨 학문을 전공하고 싶다'와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제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후배들이 환자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조우진: 저는 책을 많이 읽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기 중에 정해둔 책을 다 못 읽을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지만, 책을 많이 접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 미국 의사시험(USMLE)를 응시했을 때 책을 읽어둔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룰 때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굳은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면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 혹은 목표가 있다면.
권순호: 기회가 된다면 제3국 등 미개척 국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도움이 된다면 뿌듯할 것 같아요. 현재는 갑상선, 당뇨병, 골다공증 분야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후학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김서영: 저는 현재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 내 학회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또 역학 박사(약물역학) 학위를 받은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류마티스 치료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조우진: 미국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걸고 월드클래스의 척추센터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유능하고 꿈 있는 후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후배들을 돕는데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 최슬옹 학생기자
- kjkj3468@hanyang.ac.kr
2014-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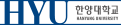 Copyrights (c) 2016 Hany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s (c) 2016 Hany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